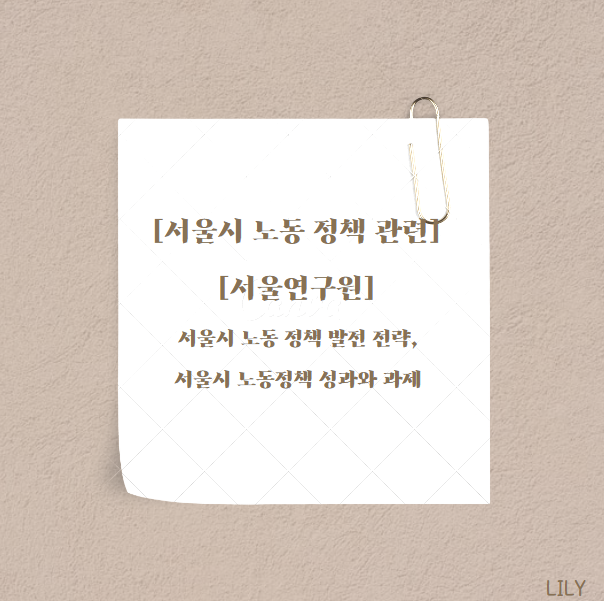
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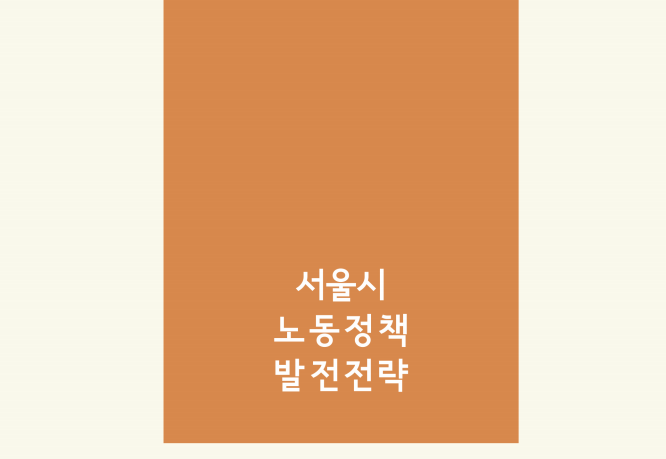
연구 요약 일부
서울시, 비정규직 7천여 명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모범적 모델’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7,322명을 정규직화했다. 1차로 2012년 1,369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했고, 2차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53명을 정규직화했거나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5세~59세 사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7천 명이 넘는 큰 규모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청소, 경비, 시설 등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적 모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 정규직은 2010년 대비 2014년 351.1%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대비 2014년 77.3% 감소하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서울시 입찰 과정에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요약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등의 정책 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으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추진 모델의 기반을 마련
서울시는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를 설치하여 노동행정 체계도 마련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노동정책 기반도 구축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짧은 기간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생활임금제 등을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제’도 서울시 민간위탁과 용역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약 근로자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진행으로 취약 근로자 권익을 향상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 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근절’, ‘산업안전법 준수’ 등의 기본권리 보장을 목표로 업종별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관련 NGO, 서울시, 지방고용청 등이 함께하여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지방고용청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과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SG 사업 점검 자료 > 사회(Social) 및 정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촌 일자리]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0) | 2023.04.13 |
|---|---|
| [결혼과 출산]30~40대 당신, 안녕한가요? (0) | 2023.04.13 |
| [정치·선거 관련]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 (0) | 2023.04.12 |
| [여성 인권 관련][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복합적 빈곤력 분석, 고령화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젠더관점에서 본 청소년 진로와 노동, 진단과 해법 (0) | 2023.04.12 |
| [지속가능보고서]함께하는 시민행동(공익 NPO단체) 자료집(시민의정감시란, 참여예산제도, 정보공개청구) (0) | 2023.03.31 |